Sorry, you have been blocked
You are unable to access bl-333.top
Why have I been blocked?
This website is using a security service to protect itself from online attacks. The action you just performed triggered the security solution. There are several actions that could trigger this block including submitting a certain word or phrase, a SQL command or malformed data.
What can I do to resolve this?
You can email the site owner to let them know you were blocked. Please include what you were doing when this page came up and the Cloudflare Ray ID found at the bottom of this page.
수필
<한국문학신문> 칼럼 54- 나를 세워 주는 붓

나를 세워 주는 붓
도정 권상호
붓은 나의 분신(分身)이다. 내 마음 가는 곳에 내 몸도 따라가듯, 내 생각에 따라 붓도 따라오기 때문이다. 몸을 움직임은 운신(運身)이지만, 붓을 움직임은 운필(運筆)이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금방 걸을 수 없듯이 붓도 금세 걸을 수 없다. 어느 정도의 연습이 필요하다. 자동차 운전(運轉)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수련 시간이 필요하듯이.
붓은 먼 인생길의 반려자(伴侶者)이다. 삶의 유혹에서 때로는 너를 잊고, 멀리하고, 미워할지라도, 너는 단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다. 어둡고 습한 길가에서 먼지를 옴팍 뒤집어쓰면서도 그냥 나를 기다리고 있다. 먹다 남은 말라빠진 먹밥 몇 알을 곱씹으며 그렇게 몇 달, 몇 해를 기다려주기도 한다. 도시 속에서 모래알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사고의 윤활유, 생활의 활력소가 바로 붓이다. 더러는 필통 속에서 목을 삐죽이 내밀고 기다리거나, 더러는 기다림에 지쳐서 필가(筆架)에서 목을 떨어뜨리고 있다. 미안한 마음에 필세(筆洗)에 사우나라도 시키면 여전히 너의 유연성, 탄력성은 나를 앞지른다.
붓은 쟁기이다. 쟁기는 흙을 일구듯, 붓은 화선지를 일궈낸다. 쟁기는 흙 속에 산소를 공급하듯이 붓은 화선지 속에 언어를 공급한다. 씨앗은 흙을 만나 햇살과 속삭이기 시작하고, 붓은 화선지를 만나 나와 대화하기 시작한다. 붓의 씨앗은 먹 알갱이이다. 적당한 물을 만나 水墨(수묵)을 이루고, 흘러서 계곡을 이루고, 모여서 강을 만들고, 먼 훗날 예술의 바다인 藝海(예해)를 이룬다. 오늘도 내 붓길엔 영롱한 이슬방울 몇 점 맺혀있다. 붓이 나를 부른다. 붓은 나를 움직이는 힘이다.
붓은 지휘봉(指揮棒)이다. 그 지휘에 따르는 악단 구성원으로는 전서, 예서, 초서, 해서, 행서 등이 있다. 악곡의 리듬에 따라 지휘 모습도 다양하다. 전서는 굴림 자세로 지휘하고, 해서는 꺾음 자세로 지휘한다. 예서는 지휘봉을 올리는 듯 내렸다가, 다시 우아하게 들어 올리는 멋스러운 동작이 글자마다 등장한다. 이런 동작을 특별히 파임이라고 한다. 세종대왕이 만들고 판본에 아로새긴 정음고체는 지휘 자세가 장중하면서 어둡지 않다. 조선 후기 궁녀들이 만든 궁체는 미끄러지듯 다시 일어서는 모양이 피겨스케이트처럼 화려하면서도 정숙함을 잃지 않고 있다. 현대 서예라는 새로운 악곡 형식과, 캘리그래피라는 실용 음악의 지휘봉은 현란하기 이를 데 없다.
나의 분신이자 반려자인 붓, 내 삶의 밭을 일궈주고 내 생각에 산소를 불어넣어 주는 붓, 그 붓은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어 내 인생길을 지휘해 주는데, 어찌 너를 붙잡지 않으리오.
붓을 잡는 일은 나를 가장 정확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믿는다. ‘붓을 잡아야지.’라는 생각은 씨앗이고, 그 실천은 열매이다. 그 실천 과정에서 먹꽃은 온 땅에 피어나고 묵향은 바람결에 스며든다. 그 붓길에서 사막을 만날 수도 있고, 더러는 질펀한 갯벌에 빠져 허덕일 수도 있다.
‘먹은 어린아이처럼 잡고, 붓은 장군처럼 잡아라.’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먹은 부드럽게 갈고, 붓은 넘치는 기상으로 잡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바쁜 세상에 언제 먹 갈아 쓰느냐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편리한 세월이라 지금은 먹을 갈지 않아도 된다. 다양한 먹물이 이미 상품화되어 나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시간은 걸리지만, 먹을 가는 것은 마음을 가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시간의 낭비는 아니라고 본다. 먹을 갈면 묘하게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기 때문이다. 슬로푸드가 건강에 좋듯, 슬로아트 서예는 영혼에 좋다.
붓질을 하면 붓골을 흘러내리는 먹물의 소리가 들린다. 붓털 사이사이를 흘러내리는 먹물. 붓 골짜기를 흐르던 먹물이 종이 바다에 이르면 파문을 일으키며 멀리멀리 퍼진다. 어느덧 협곡을 달리던 아픔도, 바위에 부딪힌 상처도 모두 사라지고 만다.
붓 창이여, 붓 칼이여. 장군이 창과 칼로 적을 무찌르지 않으면 자신이 죽는다는 각오로 잡아야 한다. 붓을 잡는 순간 가슴에 의기가 일어나고, 팔에 힘이 솟구친다.
가끔 붓을 타고 하늘을 나는 상상을 해 본다. 순간 붓은 비행기가 되고 나는 하늘을 나는 새가 된다. 순간 눈앞에는 화선지라는 은빛 현란한 설원(雪原)이 펼쳐진다. 전설을 품은 태고의 신비한 붓바람이 일자 미묘한 전율 끝에 화선지 위에는 비가 내린다. 묵우(墨雨)랄까. 붓가락은 천상의 음악을 들려주고 붓춤은 문명의 긴 강물을 따라 흐른다. 붓이 지나간 자리는 흑룡강(黑龍江)이랄까.
이른 새벽부터 붓을 타고 천상유희를 즐기다가 보면 어느덧 홍시 같은 석양을 맞이하기도 하고, 기분 좋은 피곤함에 휩싸여 붓과 더불어 밤새 뒤척이다가 보면 숯불 같은 일출에 감동하기도 한다.
1988년 1월 경남 창원시 다호리에서, 초기 철기 시대의 나무널무덤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에서 다섯 점의 붓이 출토되었다. 붓대는 나무를 깎아 만든 것으로, 양 끝에 붓털이 달린 것이 특징이다. 이 붓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출토된 것으로 기원전 2세기경에 이미 문자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된다. 그리고 동검, 칠기, 철제 농기구, 오수전 등과 함께 출토된 붓의 존재는 우리의 역사 시대의 시작까지 끌어 올려주는 좋은 근거가 된다.
붓을 가리키는 최초의 글자 ‘聿(붓 율)’은 손으로 붓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본떴다고 본다. 이 글자는 은(殷)나라 갑골문(甲骨文)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 이미 붓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몇몇 갑골편(甲骨片)에는 칼로 새긴 상태가 아닌, 붓으로 써 놓기만 했을 뿐 채 새기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보아, 붓만큼 오랜 역사를 가진 필기구도 없다고 본다. 주(周)나라와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에도 줄곧 율(聿)로만 사용해 오다가, ‘筆(붓 필)’이 나타난 것은 진(秦)나라 대전(大篆) 이후로 본다. 붓대가 주로 대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율(聿) 자 위에 竹(대 죽)을 더한 것이다.
우리는 조선 중기까지는 ‘붇’으로 표기했는데, 이는 당시의 동사 ‘붇들다(붙들다)’와 통한다. 이 ‘붇’이 일본으로 건너가 ‘ふで(후데)’가 된 것으로 본다. 은(殷)나라를 우리 선조 동이족(東夷族)이 세웠다고 믿는다면 우리말 ‘붇’에서 중국어 ‘筆(bǐ)’와 일본어 ‘ふで(후데)’가 나왔다고 보는 것도 설득력이 있다.
변명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이다.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의 말이다. 시간은 단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이 없다. 해와 달빛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불공평하게 빛을 주지 않듯이, 시간도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그 시간 중에 ‘금’처럼 소중한 ‘지금’, 나는 붓을 잡는다. 힘들 때마다 나를 세워 주는 붓, 그 붓질로 내 마음을 붙잡는다.
Comments
Sorry, you have been blocked
You are unable to access bl-333.top
Why have I been blocked?
This website is using a security service to protect itself from online attacks. The action you just performed triggered the security solution. There are several actions that could trigger this block including submitting a certain word or phrase, a SQL command or malformed data.
What can I do to resolve this?
You can email the site owner to let them know you were blocked. Please include what you were doing when this page came up and the Cloudflare Ray ID found at the bottom of this page.

 <한국문학신문> 칼럼 55…
<한국문학신문> 칼럼 55…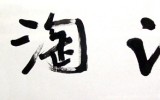 <한국문학신문> 칼럼 53…
<한국문학신문> 칼럼 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