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rry, you have been blocked
You are unable to access bl-333.top
Why have I been blocked?
This website is using a security service to protect itself from online attacks. The action you just performed triggered the security solution. There are several actions that could trigger this block including submitting a certain word or phrase, a SQL command or malformed data.
What can I do to resolve this?
You can email the site owner to let them know you were blocked. Please include what you were doing when this page came up and the Cloudflare Ray ID found at the bottom of this page.
수필
<한국문학신문> 칼럼 59- 報春三花 - 개나리・진달래・벚꽃 -
Download
報春三花
- 개나리・진달래・벚꽃 -
도정 권상호
지난 4월 11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국민에게 물처럼 맑고, 물처럼 낮게 다가올 국회의원을 모시기 위해 물날(수요일)을 투표일로 정했나 보다. 12월의 대선도 물날에 치러질 예정이란다.
나도 한 후보자를 비롯하여 20개의 많은 당(黨) 중에서 한 당을 골라 찍었다. 내 지역에 출마한 세 후보자 모두 마음에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한 후보만을 선택해야 했다. 정책이 마음에 드는 당 투표까지 모두 두 장에다 찍었으니, ‘Two 표’^^를 한 셈이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택한 후보자와 당에 도장을 또렷하게 각각 찍었다.
그런데 요란한 유세전이 끝나자 찬란한 봄꽃들이 뒤를 이었다. 그래, 이제는 봄을 봄답게 즐길 때이다. 윤달이 끼어서 그랬던지 예년보다 참으로 늦게 찾아온 귀한 꽃봄이다.
아침에 일어나 쪽을 씻으면 낯이 나타나고, 낯을 닦으면 얼굴이 드러난다. 쪽보다는 낯이 낫고, 낯보다는 얼굴이 제격이다. 낯을 얼굴로 만들기 위해 뇌를 맑게 하는 정뇌호흡을 한다. 호흡은 맑은 피를 낳고, 맑은 피는 맑은 얼을 낳는다.
세면 후에 거울 속에 비친 낯을 살펴본다. 순간 ‘눈과 귀가 왜 입보다 위에 있을까?’라고 의문을 던져 본다. 그렇지. ‘말은 적게 하고, 보기와 듣기를 많이 하라.’라는 신의 가르침이 아닐까. 소언다시청(少言多視聽)…….
눈과 귀를 열고 문밖을 나선다. 순간 봄이 오는 소리가 굉음처럼 들려온다. 꽃봉오리가 터지는 소리, 새싹이 돋아나는 소리가 어울려 ‘보춘(報春)’이라는 주제의 오케스트라 연주를 이룬다. 움은 두텁고 단단한 땅을 뚫고 터져 나오면서 드럼과 심벌즈 소리를 낸다. 무수한 봄 햇살은 대지를 향하여 씨웅씨웅 날아와 꽂히면서 다양한 현악기 소리를 낸다.
그래 봄이다. 완연한 봄이 기어코 오고 말았다. 이 땅에 봄을 알리는 꽃으로 세 가지가 있으니, 개나리 ․ 진달래 ․ 벚꽃이 그것이다. ‘보춘삼화(報春三花)’라고 이름 붙여 본다. 보춘삼화가 흐드러지게 피면 흑제(黑帝)는 물러가고 청제(靑帝)가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한다. 꽃이 나무를 감싸면 나뭇가지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때에 나무 밑에 살포시 들어가 보면 나무마다 봄의 궁궐을 이루고 있다.
춘궁기(春窮期)를 보낸 어린 시절이 있었다. 그나마 춘궁(春窮)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봄꽃이 이룬 궁궐, 춘궁(春宮)의 화려함을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리라. 거리마다 울타리마다 산기슭마다 보춘삼화의 야외 갤러리가 펼쳐진다.
길가나 언덕에 줄지어 서서 노랑 종을 울리며 봄을 맨 먼저 맞이하는 것은 개나리이다. 그래서 개나리는 한자어로 ‘迎春花(영춘화)’라고 한다. 번역하면 ‘봄맞이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봄이 왔음을 알리기 위해 개나리는 노란빛의 작은 종들을 딸랑딸랑 울린다. 개나리의 영어 이름도 재미있다. ‘golden bell’이다. 통꽃으로 생긴 개나리는 그야말로 색깔과 모양으로 볼 때, 영락없는 황금 종(鐘)이다. 금빛 찬란한 종으로 장식한 새장 모양의 개나리는 새봄의 희망을 속삭여 준다. 불꽃놀이 하듯 황홀하게 피었다가 언제 지는지도 모르게 저버리는 개나리.
‘참꽃’에 대한 ‘개꽃’, ‘참두릅’에 대한 ‘개두릅’, ‘참가죽’에 대한 ‘개가죽’의 예처럼, ‘참나리’에 대한 ‘개나리’이다. ‘개-’라는 접두사가 붙어서 어감으로 보면 ‘개나리’는 ‘참나리’나 ‘미나리’에 비해 질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수효가 너무나 많아서일까. 내 생각에는 ‘가히> 가이> 개’의 예에서 보듯이 ‘가히나리> 가이나리> 개나리’의 변화를 겪지 않았을까 한다. 여기의 ‘개-’의 의미는 ‘가까이’의 의미가 아닐까. 왜냐하면, 개는 동물 중에서 개나리는 꽃 중에서 우리와 가깝게 지내기 때문이다. 이 개나리의 원산지가 한국이라니 더욱 정감이 간다.
다음으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대한의 봄을 알리고자 작은 키를 발돋움하며 진분홍빛으로 물들이는 꽃은 진달래이다. 미주나 유럽에서 온 외국인에게 ‘진달래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잘 모른다. 진달래가 없거나 흔하지 않기 때문이리라.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 ‘azalea’라고 표기되어 있다. [어질리어]로 발음되는데, 과연 진달래꽃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노라면 ‘어질어질’ 현기증을 느끼게 된다.
진달래의 꽃말은 ‘사랑의 희열’, ‘신념’, ‘절제’이다. 사랑의 색깔은 아무래도 분홍색이 제격이다. 사랑의 기쁨을 세상에 알리고자 나팔처럼 불고 있는 진달래의 자태. 그러나 진정한 사랑의 감정과 사랑의 희열을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는 ‘신념’과 ‘절제’가 꼭 필요하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요 지나치면 후회막급(後悔莫及)이렷다.
그런데 진달래의 아름다운 꽃말과는 달리 슬픈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옛날 중국 촉(蜀) 나라 임금 두우(杜宇)가 억울하게 죽어 그 넋이 두견새가 되고, 그 두견새가 울면서 토한 피가 ‘두견화(杜鵑花)’로 변했다고 한다.
한편 우리나라 전설도 있다. ‘진’씨 나무꾼과, 한 선녀가 사랑하여 ‘달래’라는 예쁜 딸을 낳았는데, 달래는 사또의 첩 요청을 거절하다 죽음을 당하게 된다. 이에 나무꾼도 딸을 부둥켜안고 울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데, 달래의 시체는 온데간데없고, 나무꾼의 시체에서는 빨간 꽃이 피어 그 자리에 무덤을 만들었단다. 아버지의 성에 딸의 이름을 붙여 ‘진달래’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
끝으로 나무의 옷인 잎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채 벗고 피는 꽃 벚꽃, 그래서 우리말로 벚꽃은 ‘벗꽃’이라 표기해야 맞을 듯하다. 벚꽃의 영문 표기는 ‘cherry blossom’이다. 서양 벚꽃은 달콤한 열매 때문에 ‘sweet cherry’라 부른다. 벚꽃은 귀여운 계집아이가 앵앵거리는 것처럼 앙증스러워 보였는지 한자어로는 ‘櫻花(앵화)’라고 한다. 櫻花(앵화)는 ‘앵두나무 꽃’을 뜻하기도 하는데, 이는 꽃 모양이 닮았고, 버찌와 앵두도 서로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이리라. 또한, 벚꽃이 櫻桃科(앵도과)에 속하기도 한다.
벚꽃의 꽃말은 ‘아름다운 정신’, ‘뛰어난 미모’이다. 벚꽃처럼 ‘아름다운 영혼’으로 폼을 잡자. 이 봄날에 우리 국회도, 우리 경제도, 우리 사회도 겉모습이나 물량주의보다는 아름다운 영혼으로 폼을 잡았으면 한다.
봄바람이 인다. 봄날의 아침나절에는 다사로운 햇살이 은밀하게 속삭이며 다가오지만, 오후가 되면 봄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바람이 왜 불까? 나무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다. 삼투압 현상만으로는 그 많은 꽃잎과 새잎에 필요한 물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다. 바람이 불면 원심력에 의하여 물이 더 빨리 공급된다. 여름철이 되면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하기에 나무는 더 많은 잎을 튼실하게 달고, 더 많은 바람을 맞을 준비를 한다.
봄은 물이 오르는 계절이다. 바람아 불어라. 봄바람아 일어라. 보춘삼화(報春三花)가 다 질지언정……. 꽃이 무척 아름답지만, 꽃을 버려야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얼쑤.
Comments
Sorry, you have been blocked
You are unable to access bl-333.top
Why have I been blocked?
This website is using a security service to protect itself from online attacks. The action you just performed triggered the security solution. There are several actions that could trigger this block including submitting a certain word or phrase, a SQL command or malformed data.
What can I do to resolve this?
You can email the site owner to let them know you were blocked. Please include what you were doing when this page came up and the Cloudflare Ray ID found at the bottom of this p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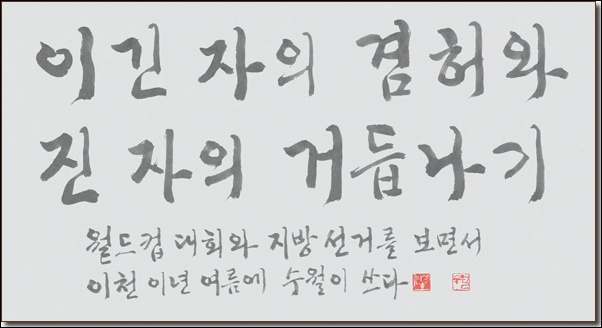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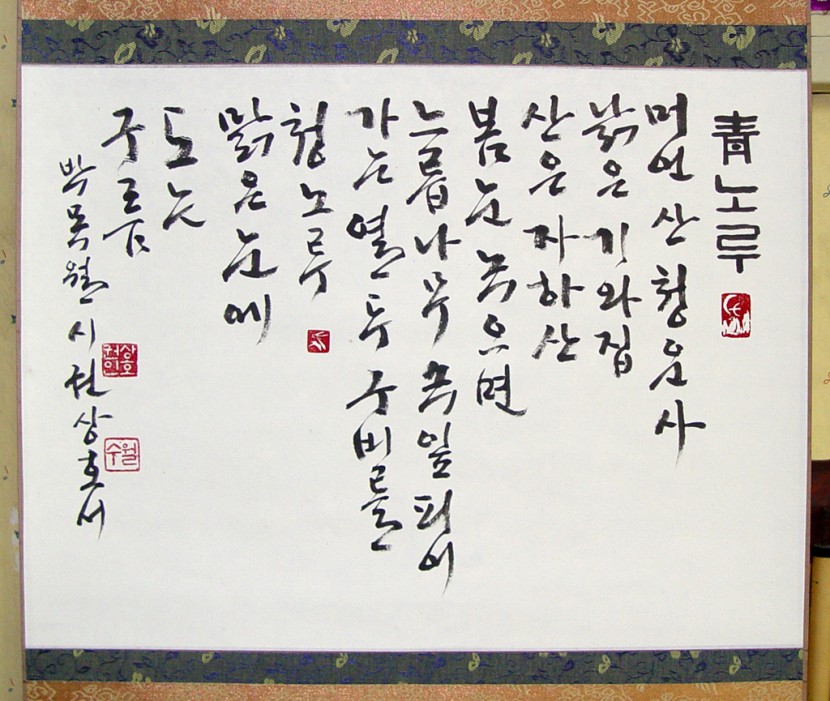
 <한국문학신문> 칼럼 60…
<한국문학신문> 칼럼 60… <한국문학신문>칼럼 58-…
<한국문학신문>칼럼 58-…






권상호
報復: 앙갚음하다. 復(돌아올 복) 돌려보내다. 뒤집다.
㚆(돌아올 복): 발로 풀무질하다.
報服: 높은 항렬의 사람이 낮은 항렬 사람의 상을 당하여 상복 따위를 입다.
服(옷 복): 옷은 사람의 몸[⺼]을 복종시킨다.
迎(맞이할 영): 사람을 맞이하려면 우러러 보면서 해야 한다.
仰은 본래 卬으로 썼다. ‘卬(나 앙, 우러러볼 앙)’은 ‘匕(서있는 사람)+卩(병부 절-> 무릎을 꿇은 사람)’에서 ‘쳐다보다’, ‘우러러보다’의 뜻이다. 반대말은 抑(누를 억), 印(도장 인)이다. 결국 抑(억)과 印(인)은 ‘누르다’라는 같은 뜻은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