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rry, you have been blocked
You are unable to access bl-333.top
Why have I been blocked?
This website is using a security service to protect itself from online attacks. The action you just performed triggered the security solution. There are several actions that could trigger this block including submitting a certain word or phrase, a SQL command or malformed data.
What can I do to resolve this?
You can email the site owner to let them know you were blocked. Please include what you were doing when this page came up and the Cloudflare Ray ID found at the bottom of this page.
도정동정
화신(火神)의 빛과 수신(水神)의 비
세계일보 문화기획- 문자로 보는 세상 13
화신(火神)의 빛과 수신(水神)의 비
‘빛’과 ‘비’는 하늘에서 내린다. 신(神)은 우주를 주재하는 초인간적·초자연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신은 어떤 징표로써 자신의 존재를 상징하고 있는데 화신은 빛으로써, 수신은 비로써 자신의 모습을 느끼게 하고 있다. ‘빛’과 ‘비’는 삼라만상이 잘 자라도록 돕기 때문에 이들이 없으면 우리는 먹고살 수 없다. 그리하여 인간은 ‘빛’과 ‘비’에게 경배를 올리고 그 행위를 일러 ‘빌다’라고 한다. 여기에서 ‘빛, 비, 빌다’ 등은 같은 단어가족으로 그 어원을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비는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빌면 남의 것을 공짜로 얻을 수 있다. 배고플 때 흔히 이웃에 양식을 빌러 다니는 행위가 그것이다. 농사를 지을 때 필수적인 빛과 비를 우리는 공짜로 사용한다. 하지만 빛과 비는 결코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은 빛을 주관하는 해님과 비를 주관하는 용왕님께 제사를 올리는 것이다.
둘째는 빈다는 것은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다. 복을 빌고, 성공을 비는 따위가 그것인데 항상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는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호소하며 사과하는 행위이다. 우리 속담에 “비는 데는 무쇠도 녹는다.”라는 말이 있다. 잘못을 사과하고 진정으로 빌면 아무리 완고한 사람이라도 용서하게 마련이다.
폭폭 찌던 폭염 뒤에 며칠간 폭우가 이어졌다. 그것도 장맛비 중의 폭우다. 폭우 중에서도 집중호우를 물 폭탄이라 하는 걸 보면 현대인은 자연현상도 전쟁으로 볼 만큼 위기의식 속에서 살고 있다. 무더위에 창문을 열어놓은 채로 자다가 이마에 잔 빗방울이 떨어져 잠에서 깨어났다. 밤새 바람이 세차게 불고 큰비가 내렸나 보다. TV를 켜자 IS 자살 폭탄 테러 소식이 흉흉하게 들려오고 남쪽에서는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이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중부지방은 ‘마른장마’라 하더니, 알고 보니 마른장마가 아니라 말은 장마였다. 장마라는 말 자체가 여름철에 많은 비가 계속해서 내린다는 뜻이니 ‘마른’이라는 수식어는 애초 어법에 맞지 않다고 본다. 기상예보가 잘못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만들어놓은 예비 단어인가. 마른장마가 맞는 말이라면 젖은장마도 있어야 하지 않는가.
‘장마’의 ‘장’이 ‘길다[長]’의 뜻일 터이니, ‘마’는 아마 ‘여름의 마파람과 함께 내리는 비’라는 뜻이 아닐까. 뱃사람들은 남쪽을 ‘마’라 하고, 남쪽에서 불어오는 여름 바람을 ‘마파람’이라 한다.
장마를 가리키는 말에 임우(霖雨), 음우(霪雨, 陰雨), 매우(梅雨), 장우(長雨), 구우(久雨) 등이 있는 걸 보면, 장마의 종류가 많기도 하다. 이는 장마가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면서도 그때마다 서로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일 것이다. 임우는 숲까지 씻어주는 가뭄 끝의 장마이나, 음우는 어감으로 볼 때 피해가 큰 답답한 장마이다. 매우는 매실이 익을 무렵의 장마로 길지 않은 낭만적인 장마이나, 장우와 구우는 이름처럼 길고 지루한 장마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장마이다.
겨울의 삼한사온(三寒四溫)처럼 며칠간의 장마 끝에 다시 햇살이 나왔다. 장마 ‘빗줄기’ 대신에 햇살 ‘빛줄기’가 아름답기만 하다. 풍년을 위해서는 갈마드는 빗줄기와 빛줄기가 고마울 뿐이다. 빛줄기의 조명을 받은 북한산 자락이 아직 빗기를 머금은 탓에 상큼하게 빛난다. 나도 모르게 백운대에 하이파이브하고 두 손을 모은다. 기도를 위해 손을 비비는 행위가 비굴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느껴진다. 순간 창세기 1장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조는 하늘에서 내리비치는 빛, 빛살 또는 햇살을 문자로 어떻게 표현했을까? 처음에는 가늘고 기다란 작대기 모양의 ‘통할 곤(丨)’ 자로 표현했었다. 그런데 빛이 점차 신격화되면서 햇살은 ‘곤(丨)→ 신(申) → 신(神)’의 단계를 거치면서 신(神, god)으로 완성된다.
곤(丨)의 첫 변화는 신(申)이었다. ‘신(申)’ 자는 먹구름을 뚫고 터져 나오는 번개 빛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천둥과 번개가 가장 심한 음력 7월을 신월(申月)이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알고 보면 신(申) 자는 낯 뜨거울 정도로 절묘한 음양 교합의 모습을 하고 있다. 나중에 번개의 뜻은 전(電) 자로 대신하고, 신(申)은 그대로 ‘빛’이나 ‘신’의 뜻을 지키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빛의 형상은 ‘신(神)’으로 탄생한다. 이 글자는 시(示)와 신(申)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의 ‘보일 시(示)’ 자의 갑골문 형태는 ‘높은 제단’을 가리켰다. 그러나 지금은 하늘에서 내리비치는 햇살 세 줄기로 보인다.
‘빌 축(祝)’, ‘빌 기(祈)’, ‘빌 도(禱)’, ‘참선 선(禪)’, ‘보일 시(視)’ 등의 글자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시(示) 자는 ‘위[亠]’에서 지상으로 삼광(三光)이 내리 비치는 모양이다. 여기서 삼광은 햇빛, 달빛, 별빛을 가리킨다. 삼광을 구체적으로 일월성신(日月星辰) 또는 일월성수(日月星宿)라 하는데, 일월성(日月星)이라 해도 될 것을 언어 관습상 사자성어로 만들기를 좋아하여 만든 말이다. 그중에서도 수효가 많은 별만을 성수 또는 성신으로 나타낸 것이 재미있다. 신은 빛으로 보이니 언제나 밝다. 그래서 천지신명(天地神明)이라 하는 것이다.
건축에서 상량문에는 ‘빛’과 ‘비’가 공존한다. 빛의 신인 삼광(三光)에게 인간의 오복(五福)을 기원하며, 비의 신인 용(龍)과 거북[龜]에게 화마(火魔)로부터 집을 보호해 달라는 소망을 적고 있다. 거북은 신령한 동물로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귀(龜)/라고 발음해야 옳다.
여러 사람 중에 빛나는 사람을 ‘스타’라고 한다. 별빛이다. 북녘에는 오직 한 사람을 신격화하여 ‘태양’만이 존재한다. 그곳에서는 달빛과 별빛은 무색하다.
농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빛과 비다. 빛과 비는 발음도 비슷하지만 ‘빌어야’ 할 기원의 대상이다.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알맞은 빛과 비가 내려야 함은 절대적이다. 뭐든 지나치면 ‘폭’이다. 빛이 지나치면 폭염이요, 비가 지나치면 폭우가 된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비가 때맞추어 알맞게 내리고 바람이 고르게 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순풍조(雨順風調)를 대문에 써 붙이기도 한다.
빛을 숭배하는 것은 아마 인류 공통일 것이다. 우리말의 ‘빛’, ‘비치다’, ‘불’, ‘붉다’, ‘밝다’, ‘봉화(烽火)’, ‘백(白)’ 등의 단어의 공통점은 ‘ㅂ’으로 시작한다는 데에 있다. 영어의 브라이트(bright)까지 들이대면 지나친 억측이겠지. 올가을에는 볕 좋은 마당에 벼를 말리고 싶다.
신에게든 인간에게든 비는 행위 그 자체로는 돈이 들지 않고, 빌면 소원대로 이루어지며, 지난 잘못까지도 용서되니,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으랴.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두 손 모아 비옵나니, 부디 지구를 살리시고 이 땅에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Comments
Sorry, you have been blocked
You are unable to access bl-333.top
Why have I been blocked?
This website is using a security service to protect itself from online attacks. The action you just performed triggered the security solution. There are several actions that could trigger this block including submitting a certain word or phrase, a SQL command or malformed data.
What can I do to resolve this?
You can email the site owner to let them know you were blocked. Please include what you were doing when this page came up and the Cloudflare Ray ID found at the bottom of this page.


 운명과 숙명 그리고 행운
운명과 숙명 그리고 행운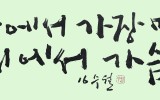 성(性)이 성났다
성(性)이 성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