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rry, you have been blocked
You are unable to access bl-333.top
Why have I been blocked?
This website is using a security service to protect itself from online attacks. The action you just performed triggered the security solution. There are several actions that could trigger this block including submitting a certain word or phrase, a SQL command or malformed data.
What can I do to resolve this?
You can email the site owner to let them know you were blocked. Please include what you were doing when this page came up and the Cloudflare Ray ID found at the bottom of this page.
도정동정
세계일보 문화기획- 문자로 보는 세상 27- 자연을 닮은 한옥 이야기
세계일보 문화기획- 문자로 보는 세상 27
자연을 닮은 한옥 이야기
자연(自然)은 인간의 힘을 받지 않고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저절로 이루어지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인간은 환경보호 또는 자연보호라는 이름으로 친자연적인 행위를 하는 것처럼 떠들어 왔지만, 지나고 보면 문명화 또는 현대화라는 이름 아래 반(反)자연적인 행위만 자행해 왔다. 인지(人智)의 발달로 인간 생활은 더 풍부하고 편리해졌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인간 정신은 날이 갈수록 더 피폐하고 잔인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표방한 개인주의는 점차 이기주의로 전락하여, 마침내 인간소외 현상을 낳고 있다.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어쩌면 인류는 더 가난해지고 더 불편해져야 인성(人性)을 회복하고 더불어 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문화(文化)란 말 안에 ‘될 화(化)’ 자가 들어있는 걸 보면, 문화는 변화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변화의 속성에 따라 우리의 전통문화는 우리의 현대문화로 바뀌어야 정상인데, 공교롭게도 서양문화로 바뀌어 버렸다. 우리는 늘 입어오던 우리 옷을, 부르던 대로 ‘옷’이라 하지 못하고 ‘한복’이라 불러야 하고, 우리가 짓고 살아오던 우리 집을 그냥 ‘집’이라 하지 못하고 ‘한옥’이라 불러야 하는, 거꾸로 된 세상에 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전통문화는 손님이 되고, 손님이 가져온 서양문화가 주인이 되어 버렸다.
솔직히 ‘전통문화’라 하면 시대 감각이 뒤떨어져서 보호해야 할 문화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기능과 편리 위주의 서양식 건물 대신에, 다소 불편한 전통한옥 건설을 고집하는 곳이 있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자연을 닮은 순수 한옥마을, ‘정와(靖窩)’가 바로 그곳이다. ‘정와’라는 마을 이름은 ‘편안할 정(靖)’ 자와 ‘보금자리 와(窩)’ 자를 써서 ‘편안한 보금자리’ 정도의 겸손한 의미를 담고 있다.
붓글씨를 즐기는 필자는 가끔 현판이나 상량문 등의 부탁을 받곤 하는데, 지난 4월에는 인천국제공항 제2청사 상량문을, 6월에는 이곳 ‘정와’ 한옥마을의 상량문을 쓴 것이 인연이 되었다. 그 사이 세미나장 또는 공연장으로 사용될 가장 큰 건물, ‘관효당(觀曉堂)’이 완공되고 현판 글씨도 쓰게 되었다. 서각은 김용복 작가가 맡았다.
상량(上樑)이란 기둥에 보를 얹고, 그 위에 마룻대를 올리는 일을 말한다. 마룻대에는 이 건물이 하늘과 땅으로부터 축복받기를 기원하는 내용을 적는데, 이를 상량문(上樑文)이라 한다.
건물의 문루에 가로 붙이는 현판(懸板)은 그 집의 얼굴로서, 그 집의 성격까지 일러준다. 그래서 현판 글씨는 멀리서도 잘 보이게 쓰는 것이 상례이고, 드나드는 많은 사람의 시선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주의를 기울여 써야 한다. 현판 글씨는 찾아오는 이를 반갑게 맞이해 주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 쓰면 오가는 이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현판 글씨는 반드시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사람의 기운을 모아 붓을 잡아야 하며, 글자는 무거우면서도 어둡지 않게, 아름다우면서도 넘치지 않게 써야 한다. 이처럼 대중 속에서 대중과 함께 호흡하며 쓰는 붓글씨를 필자의 경우 ‘라이브 서예’라 명명했다.
‘관효당(觀曉堂)’은 ‘볼 관(觀)’, ‘새벽 효(曉)’ 자를 써서, 북한산의 ‘원효봉(元曉峰)을 바라보는 집’, ‘첫새벽을 맞이하는 집’이란 뜻이다. 원효봉이란 명칭은 본래 원효봉 아래에 있는 원효암에서 유래한 것이고, 원효암은 신라 시대 원효(元曉)대사가 수도하였던 토굴이었다. 그리고 원효대사는 원효라는 법명 그대로 이 땅에 불교의 새벽을 연 승려였다.
관조(觀照), 관심(觀心)이라고 할 때의 ‘관(觀)’은 조용히 대상의 본질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뜻이다. ‘관(雚)’ 자는 자전에는 ‘황새’로 풀이하고 있으나, 글자의 모양을 보면 머리 위에 댕기깃을 달고 있는 새처럼 보인다.
‘새벽 효(曉)’는 세상이 밝아오기 전의 처음 빛을 말한다. 우리말 ‘새벽’은 동쪽을 뜻하는 ‘새’와 밝아온다는 뜻의 ‘밝’이 합쳐져서 된 말로 보인다. 새벽의 고어는 ‘새박’, ‘새배’ 등이 있는데, 의미가 서로 통하는 ‘열 벽(闢)’의 영향을 받아 지금처럼 ‘새벽’으로 된 것 같다. 새벽은 ‘동트기’라고도 한다.
그리고 한옥(韓屋), 양옥(洋屋)이라 할 때의 ‘집 옥(屋)’은 ‘곤한 몸[尸]을 이끌고 돌아와[至] 쉬는 집’을, 사당(祠堂), 명당(明堂)이라 할 때의 ‘집 당(堂)’은 ‘신을 숭상[尙]하는 언덕[土] 위의 집’으로 당집을 뜻한다.
4만6천 평의 대지 위에 별채를 제외한 전통한옥 50채, 현대한옥 22채, 초가집 35채, 너와집 5채 등 모두 112채의 한옥마을이 건설될 예정인바, 그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때론 열정을 지나 무모한 작업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촌장은 인생의 자양분이라 할 수 있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부모로부터 받은 ‘우리 것’에 대한 아련한 추억에서 생의 에너지를 얻고 있었다. 2008년에 시작된 공사는 2018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마다 빛축제, 음악회 등의 문화행사와 함께 부분 개장을 하였다. 게다가 테라피(therapy) 효능의 구절초 한증막, 피톤치드 가득한 잣나무 둘레길 등도 개설되어 그야말로 천년한옥 글로벌 관광단지로 발돋움할 것이 기대된다.
순수한옥은 흙, 나무, 돌로만 지어진다. 시멘트나 화공 약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창호지도 따지고 보면 나무로 만든 것이다. 한옥은 목재가 가장 큰 관건인데, 궁궐을 지을 때 사용한 울진, 삼척의 금강송을 사용했다. 금강송은 영하 20도와 영상 30도의 해풍을 견뎌낸 소나무로 송진(松津) 함량이 많아 압축 강도와 휨 강도가 매우 뛰어나다. 입동에서 입춘 사이에 취목하여 적어도 5년 이상의 건조 기간이 필요하다니, 한옥 건축도 서예처럼 슬로우 아트란 생각이 든다. 황토와 숯 그리고 짚으로 만든 숨 쉬는 벽돌, 1,3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소성한 노당기와를 사용하였다니 천연 한옥의 신화가 눈앞의 현실로 나타나는 듯하다.
그리고 한옥은 목재의 모양에 따라 집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서 미리 설계할 수 없다. 그래서 한옥은 시작부터 자연을 닮을 수밖에 없다.
다소곳한 초가처럼 극구 자신의 이름을 사양하는 촌장은 지난날 조상들의 주거공간이 하나씩 훼손되어 가는 현장을 보고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필생의 사업(Lebenswerk)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한옥마을 건설을 버킷리스트(Bucket list) 1번으로 정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친환경적인 순수한옥을 후손들한테 영원히 남기고 싶어 예술적 접근을 했다는 것이다. 신이 자연을 창조했다면, 인간은 예술을 창조했다. 그에게는 자연을 닮은 한옥을 짓는 일이 예술 창조였다. 천 년 후에도 기억될 정와의 얼굴은 아무래도 대목수 송덕영, 송덕남 형제 그리고 와공 최정국 씨라 생각한다. 그들의 손길에 기립박수를 보낸다.
김필영 시인은 관효당 개관기념 헌시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살아가는 일이, 집 한 채 짓는 일이라면 멋진 한옥 한 채 지어 살고 싶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와집 용마루는 하늘을 향해 두 팔을 활짝 펼쳐 기도하고, 초가지붕은 처마를 드리워 대지를 감싸고 있다. 천지를 지키는 한옥은 그래서 우주와 하나가 된다. 그 따뜻한 가슴에 가족을 품고서...
Comments
Sorry, you have been blocked
You are unable to access bl-333.top
Why have I been blocked?
This website is using a security service to protect itself from online attacks. The action you just performed triggered the security solution. There are several actions that could trigger this block including submitting a certain word or phrase, a SQL command or malformed data.
What can I do to resolve this?
You can email the site owner to let them know you were blocked. Please include what you were doing when this page came up and the Cloudflare Ray ID found at the bottom of this p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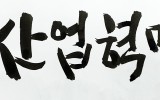 KBS 캘리그라피 준비
KBS 캘리그라피 준비 월간해인 2016. 11월호. 권두언…
월간해인 2016. 11월호. 권두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