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rry, you have been blocked
You are unable to access bl-333.top
Why have I been blocked?
This website is using a security service to protect itself from online attacks. The action you just performed triggered the security solution. There are several actions that could trigger this block including submitting a certain word or phrase, a SQL command or malformed data.
What can I do to resolve this?
You can email the site owner to let them know you were blocked. Please include what you were doing when this page came up and the Cloudflare Ray ID found at the bottom of this page.
보도자료
오직 오늘의 오감으로
오직 오늘의 오감으로
도정 권상호
입술을 동그랗게 하고 /오/라고 발음해 보세요. ‘오늘도 OK!’. 모두 옳았어요! All right!
표현의 주체인 나도 ‘吾(오)’로 발음합니다. 과거와 미래의 중간에 ‘오늘’이 있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오늘’만 살다가 갑니다. 하루의 중간은 ‘午時(오시)’, 숫자 1~10의 중간도 ‘5’입니다. 河圖(하도)와 洛書(낙서)의 중간 숫자도 ‘五’이죠. ‘吾’를 중심으로 八方(팔방)과 八字(팔자)가 둘러싸고 있고, 숫자 ‘5’를 중심으로 여덟 개의 숫자가 음양으로 갈마들며 둘러싸고 있습니다. 팔도강산이나 팔방미인도 여기에서 나오지요. 悟得(오득)하셨나요?
한글 ‘오’자는 대지 한가운데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ㅗ’는 대지 위에 솟아나는 새싹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도전하는 사람, 또는 움트는 창작 의욕의 이미지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서예창작은 일반적으로 3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무엇을 쓸 것인가’ 하는 選文(선문) 과정, ‘어떤 서체로 쓸 것인가’ 하는 選體(선체) 과정, ‘어떻게 구도를 잡을 것인가’ 하는 章法(장법) 과정 등이 그것입니다. 먹빛, 붓맛, 자형, 구도 등 귀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아무래도 내용(contents)일 것입니다. 내용은 ‘選文(선문)’과 관련이 있고, 최고의 선문은 ‘作文(작문)’입니다. 글씨 좀 못쓰면 어때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제일 곱다고 하듯이 잘못 지어도 ‘자기 글(吾文)’, 잘못 써도 ‘자기 글씨(吾書)’가 최고지요.
서예에서 九宮紙(구궁지) 중심에는 항상 표현의 주체인 ‘吾’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에는 표현을 뜻하는 口(입 구)가 들어있지요. 그럼 무엇을 표현해야 할까요?
첫째, 남의 얘기는 말고, ‘나의 이야기를 쓰자’는 것입니다. 붓을 내 몸이라 생각하고 나의 정체성(identity)을 찾아 ‘오직 吾人의, 오로지 오늘의 오감을’ 표현해 보자는 것이죠. ‘오감’은 ‘五感(오감)’이기도 하고 ‘吾感(오감)’이기도 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는 ‘생각의 근육’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근육에서는 힘이 나오지만, 생각의 근육에서는 창작(creation)이 나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나의 상상을 글로 쓸 때, 생동감이 넘칩니다.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글을 한글세대가 보고 좋아할 리 없습니다. 물론 ‘읽는 서예’가 ‘보는 서예’로 바뀌었다고 강변할 수는 있지만요.
둘째, ‘오늘의 이야기를 쓰자’는 것입니다. 백년 후의 사람들이 컴퓨터 시대를 살아간 나를 보고 ‘저 사람 조선시대 사람 아니야?’ 라고 비웃을 일을 생각하니 쪽팔리지요.
책을 읽거나 영상물을 보다가 ‘이것이다’ 하고 메모해 두기도 하고, 경전이나 시집에서 내용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이는 결국 완전한 내 것이 아니라 남의 생각이죠. 엄밀히 말하자면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백운 이규보는 이를 두고, 서툰 도둑이 옛사람의 뜻을 몰래 훔쳐 가는 拙盜易擒體(졸도이금체)라 했답니다.
옷을 만들려면 옷감이 필요하고, 요리를 하려면 식자재가 필요하듯이 글을 쓰려면 글감이 필요합니다. 붓을 잡게 하는 동인(motive)은 항상 글감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동기유발이 중요하듯이, 서예도 ‘붓 꼴림’을 불러일으키는 글감이 있어야 걸작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글감은 시대성과 현장성을 지닌 글감입니다. 이러한 싱싱한 글감으로 요리한 작품이라야 비로소 창조성과 역사성을 지닐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술가는 시대의 대변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코로나를 배제한 글은 죽은 글이나 다름없습니다. 격리 상태에서 ‘나의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를 자기 방식대로 창작하여,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로 공유하며 즐길 때, 진정한 시대성이 있는 이 시대의 서예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씨를 쓰는 과정은 잠시도 멈출 수 없는 무용이나 음악과 같은 긴박한 시간예술이지만, 그 끝은 언제나 그림이나 조각과 같은 공간예술로서 영원한 결과물로 남는다는 데에 서예의 매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하나마 오늘도 붓을 잡는 까닭입니다. <끝>
Comments
Sorry, you have been blocked
You are unable to access bl-333.top
Why have I been blocked?
This website is using a security service to protect itself from online attacks. The action you just performed triggered the security solution. There are several actions that could trigger this block including submitting a certain word or phrase, a SQL command or malformed data.
What can I do to resolve this?
You can email the site owner to let them know you were blocked. Please include what you were doing when this page came up and the Cloudflare Ray ID found at the bottom of this p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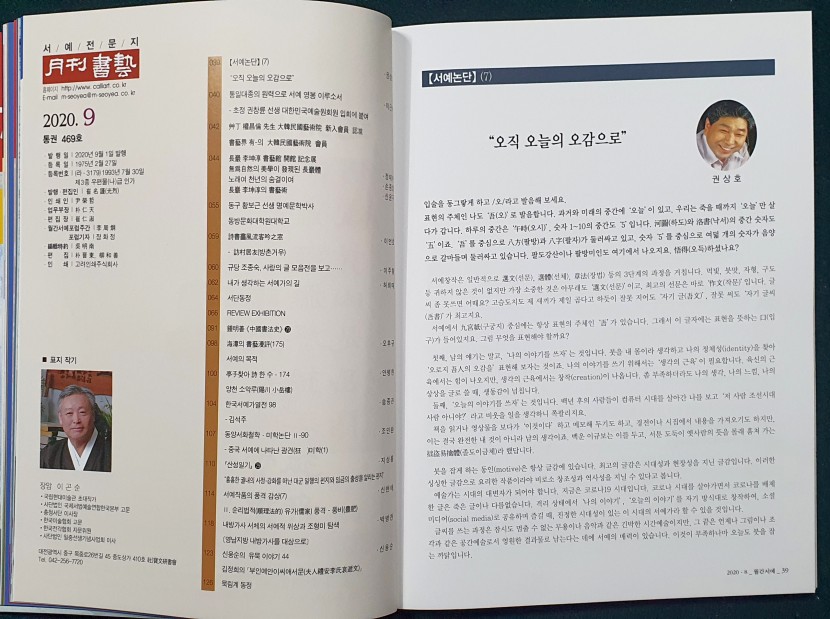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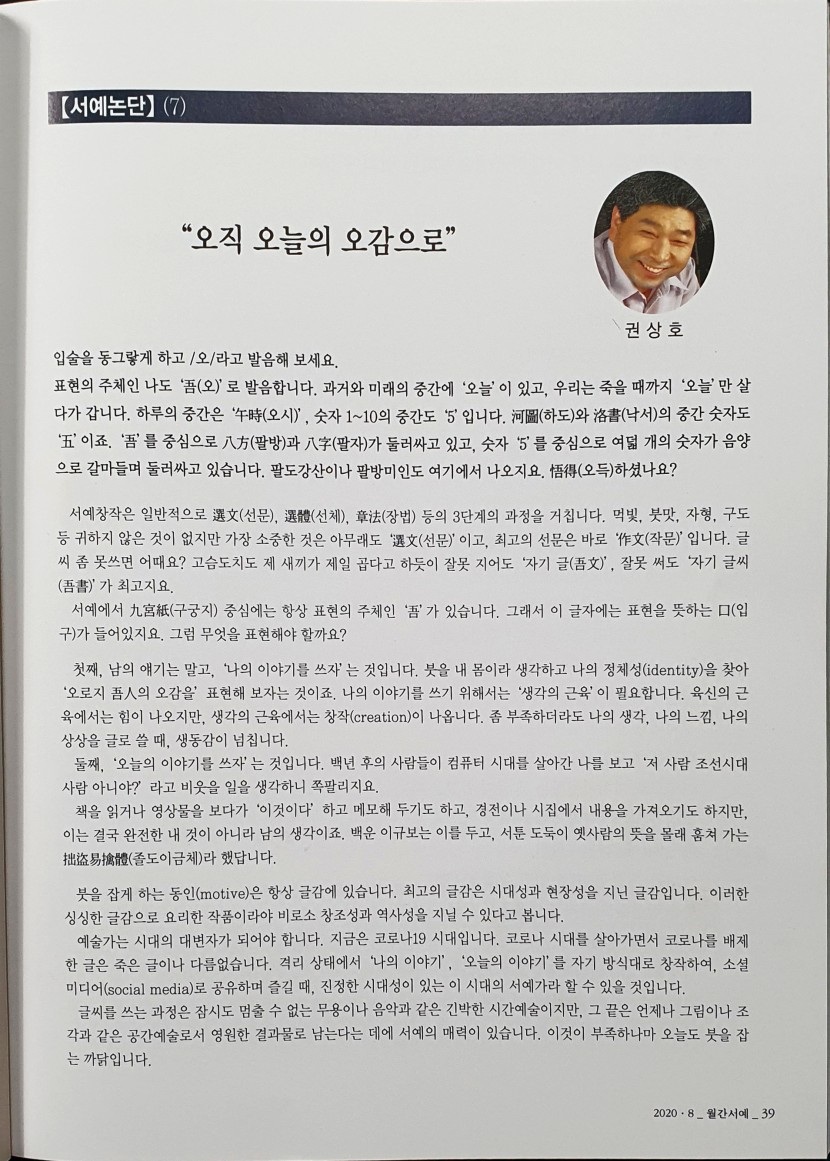
 “한국문화, 소수민족 축제 사로잡았다…
“한국문화, 소수민족 축제 사로잡았다… 2020 한국서예가협회전
2020 한국서예가협회전





